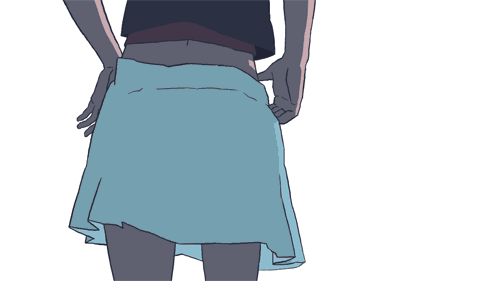60여년이나 되는 삶을 살아오면서 후회되는 일이 어찌 한 가지만 있을까마는, 딱 한 가지를 말해보라고 한다면 나는 내가 결혼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또 거기에 부수되는 문제로서, ‘결혼식’을 올려 많은 하객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을 또한 몹시 후회하고 있다.
내가 결혼한 것은 1985년 12월, 그러니까 내가 서른다섯 살 때였다. 그때만 해도 결혼이 ‘선택과목’이 아니라 ‘필수과목’으로 여겨질 때라서, 나는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 결혼이라는 대사(大事)를 겁도 없이 치르게 된 것이다.
지금은 ‘싱글맘’이 생겨날 정도로 독신주의 문화가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래서 결혼을 ‘필수과목’이 아닌 ‘선택과목’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 내가 인생을 꽤 오래 살아오면서 느끼게 된 것도 역시, 결혼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짝을 못 구해 독신자가 되는 게 아니라, 결혼 역시 그 사람의 성품이 ‘결혼 체질’이라야만 행복한 삶을 위한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이제 확실한 결론으로 이끌어내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남녀는 ‘결혼 체질’과 ‘독신 체질’로 나뉜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얘기다.
나는 3년 같이 살고서 1년 별거하고 나서 합의이혼을 했는데, 이혼 전후로 받은 스트레스는 정말 상당한 것이었다. 그것은 아마 나의 전처 역시 나와 같았을 거라고 본다.
우리가 이혼을 결행하게 된 것은 성격 차이나 성적(性的) 차이 같은 것 때문이 아니었다. 전처는 확실히 결혼 체질이었던 것 같은데(나와 이혼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 곧 재혼했으므로), 내가 결혼 체질이 아니라 독신 체질인 것이 이혼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했다. 나의 그런 체질은 이혼 이후 그대로 삶에 적용되어, 아직껏 독신으로 지내고 있다.
요즘은 마흔 살 먹은 총각이 흔하지만, 내가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남자는 서른 살 전후까지는 결혼해야 하는 걸 사회적 철칙으로 삼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서른 살이 넘은 이후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직장(대학교수)도 안정돼 있는데 왜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느냐”는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그래서 서른다섯 살이 되던 해 여름부터 드디어 결혼하기로 작심하고,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전처와 겨울에 결혼식을 올린 것이었다.
신혼 6개월 동안은 그런대로 행복했다. 그런데 그 뒤부터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을 알게 되었다. 우선 둘이 같이 자는 것도 불편했고, 저녁 시간이 자유롭지 못한 것도 불편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돌출하며 나나 전처나 심신이 몹시 고단해졌다.
지금 생각하면 전처에게 내가 참 미안한 짓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 전처는 꽤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가 잦은 병(이를테면 종기나 심한 감기 등)에 시달리는 등 정신신체증 비슷한 게 자주 찾아와 괴로워하는 것으로 그녀에게 부담을 안겨줬기 때문이다. 그래서 별거를 했다가 다시 합쳐보기도 하며 어려움을 타개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엔 합의이혼으로 종지부를 찍게 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혼을 하고 보니 결혼식을 해서 바쁜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며 하객 노릇을 시킨 게 영 마음이 걸리는 것이었다. 호텔에서 하지도 않고 작은 규모로 적은 인원을 초대하여 식을 거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못내 마음이 찝찝하였다. 그래서 결혼식을 올린 게 또 한없이 후회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도 나는 많은 결혼식에 초대를 받고서 하객으로 참석하는 일이 잦은데, 세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이 이혼하는, 이혼율이 35%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왜 그토록 비싼 결혼식을 해야 하나 하는 의구심을 느낄 때가 많다. 요즘에 웬만한 집안에서는 으레 호사스러운 호텔 결혼식을 하는 게 보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싼 꽃으로 식장을 도배하고 비싼 식사를 제공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축하객을 늘리기 위해 아르바이트생까지 써가며 호화결혼식을 올리는 요즘의 결혼 풍토는 정말 시정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로맨틱한 서구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단 둘이 결혼 절차를 밟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는 내가 결혼한 것 자체와, 결혼식을 올렸다는 사실이 몹시도 후회되는 것이다.
<마광수 | 연세대 교수>
출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