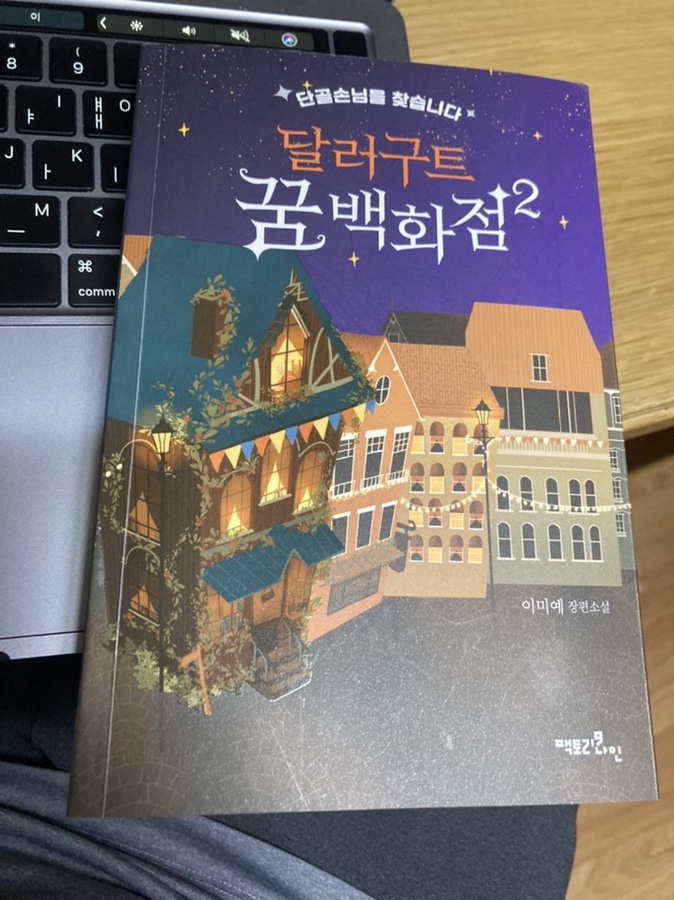1권을 정말 형편없는 마음으로 읽었다. 소설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중간에 쉬면서도 꾸역꾸역 읽은 것이 드물 만큼 꾸역꾸역 읽었다. 문체, 설정, 이야기를 풀어가는 과정 전부 내 스타일이 아니었다. 적어도 내가 볼 때엔 책에 칭찬할 부분은 적었고 아쉬운 부분은 많았었다. 꾸역꾸역이라도 어쩄든 읽게 만든 것이 장점이라고 해야 할까. 왜 그렇게 욕을 하면서도 읽었을까. 평소엔 남들이 좋다고 하면 시큰둥하게 어 뭐 그러거나 말거나… 하는 방식으로 작용하는 중2병스러운 심리가 왜 여기엔 작용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원래는 책을 보다가 다음 일정의 시간이 돼서 덮은 이유 외의 이유, 재미가 없다거나 읽기 힘들다거나 몰입이 안 된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두 번 이상 덮으면 다시 펴는 일은 없는데 1권은 몇 번이나 욕을 하면서도 꾸역꾸역 끝까지 읽었다. 그리고… 2권에서… 1권의 단점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이쯤 되면 문제는 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2권을 산 나에게 있다. 1권이 백만무나 팔렸다는데 문제가 책에 있을 리 없다. 문제는 남들이 재밌게 읽은 책에 까탈스럽게 구는 나에게 있는 게 분명하고, 나와 맞지 않아 1권에서 이미 데여놓고도 2권을 주문한 나에게 있다.
구로디지털단지에 유니짜장을 맛있게 하는 집이 있다고 해서 점심 미팅이 있는 김에 그곳에 방문한 적이 있었다. 특별히 비싸거나 싸다거나 하진 않았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냥 다른 집 보다 천 원 정도 비싸다고 생각했었다. 납득 못할 만큼 비싼 가격은 아니었다. 업무협의가 조금 일찍 끝나 남들 점심 먹는 시간보다 조금 빠르게 그 곳엘 갔는데(맛집이라는 곳에 실망을 많이 해서 그리 기대는 하지 않고 갔다) 이미 웨이팅. 심지어 주변에 먹을 곳도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주변 가게 중 이곳만 웨이팅. 십여 분쯤 기다리고 자리에 앉았는데 접객 매너도 그리 훌륭하지 못하다. 물론 굉장히 바빠 보이기도 했지만 불러도 오지도 않고… 물도 안 준다. 매우 바빠 보여 그러려니 하긴 했지만, 기분이 좋아질 접객은 분명히 아니었다. 받은 음식도 그냥저냥… 시그니처라는 유니짜장은 특별히 맛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정도의 딱 그냥저냥 한 수준이었고 탕수육은 평균에서 훨씬 미달… 최근 내가 다니는 중국집이 모두 탕수육이 맛있는 편이긴 하지만 여긴 그런 곳과 비교해서가 아니더라도 수준 미달이다. 그러나 그곳은 어디 관광지나 번화가에 있는 맛집이 아니었다. 평일 낮 장사에서 많은 비율의 매출이 나오는 사무실 밀집 지역에 있는 중화요리집. 여기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첫 방문이 아닐 거다. 내가 갔던 그날이 특별히 음식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날은 아니었을거다. 대중의 입맛은 그곳이 괜찮은 식당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실제로 식사를 마치고 일어날 때까지 웨이팅은 풀리지 않고 꽤 넓은 식당에 빈자리가 나자마자 바삐 치우고 다음 손님이 그 자리에 앉아 음식을 주문했다. 그들의 입은 옳다. 많은 사람이 옳다고 말하고 있었다. 내 입이 틀렸다. 내 입이 대중적인 부분과 떨어져 있는 것이다. 다만… 탕수육을 시킨 테이블은 거의 없었다.
이 책의 1권도 그런 느낌이었다. 책을 산 것도 출간 시기에 비해 매우 많이 늦었고, 책을 사놓고도 한참 후에 읽었다. 보통이라면 책을 놓고도 남았을 만큼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는데, 답지 않게 남들이 좋다고 하니 그냥 끝까지 본 걸까. 하는 자기반성적인 생각을 하다가 문답을 시작한다. 아무리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되물어봐도 책을 중간에 놓지 않고 끝까지 다 읽은 이유, 2권을 집어들은 이유는 남들이 읽으니까… 그거 하나뿐이다. 남들이 다 읽으니까, 안 읽으면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혹은 남들에 비해 뒤처지기 싫으니까…? 무슨 이유를 가져다 붙이든 이유는 그거 하나다. 책 이야기를 할 누군가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끄러운 이유로 오늘도 소비를 하며, 내 취향에 맞지 않는 것들을 참아낸다. 이미 그런 건 회사에서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군가 술 먹는 걸로 이야기할 때 내가 자주 하는 말이다. 인생이 충분히 쓴데 다른 쓴 걸 또 먹어야 하냐고. 쓰다는 걸 분명히 예상했음에도 망설임 없이 집어 들었다는 것. 그 쓴 걸 기대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이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 꾸역꾸역 씹어 삼켰다는 것. 맛없음에 대해 이렇게 장문으로 기나길게 투덜거리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어리석다고 할 수 있겠다.
나는 대체 왜 이 책의 2권을 전혀 망설임 없이 구매했을까. 실제로 전혀 망설임 없이 집어 들었다. 심지어 서점 가기 전날에 ‘창백한 푸른 점’을 사면서 같이 사기로 마음먹은 책 두 권에 이 책이 포함돼 있었다. 책값이 저렴하지도 않고, 심지어 1권이 리디셀렉트에 올라왔으니. 시기가 머냐 가깝냐의 문제일 뿐 2권도 리디셀렉트에 올라올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동적으로 집어 들지도 않고, 구매할 계획까지 세우고 서점에 방문했다. 왜 그랬을까. 당연하게도 책이 재밌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구매했고, 1권에 이어 2권 역시 그런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이런 기대는 좀 저버려도 될 텐데. 그러나 이것은 모두 나의 책임이다. 첫 번째는 실수가 아니지만 두 번째는 실수가 아니다. 1권을 산 건 실수 일 수 있지만 2권을 산 건 실수가 아니다.
변명을 조금 해 보자면, 책을 읽고 나서 이렇게 팔리는 책을 실시간으로 보는 것 자체가 처음이었다. 내가 책을 읽고 난 이후로 가장 잘 팔리는 소설. 몇십만 부 정도의 책은 가끔 나왔지만… 백만 부라니. 책의 두께가 3센티라고 가정하고 백만 권을 쌓으면 3,000,000센티, 30,000미터. 30 킬로미터.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인 제2 롯데타워가 555미터 정도니까 그 높이만큼 대충 쉰 다섯번을 쌓을 수 있다. 우주라고 기준삼는 높이의 1/3.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높이의 대략 세 배다. 1권의 판매량 만으로도 그렇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팔렸다. 판매금액이라던가 인세라던가 하는 세속적인 부분은 차치하고,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이런 축제 비슷한 일에 끼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내가 모르는 어떤 재미가 있겠지… 뭔가 다른게 있겠지… 하는 마음 절반으로 끝까지 읽었었던 것 같다. 중반 이후부터는 책의 이야기가 궁금했다거나 재미있다 라기보다는 미지의 탐구 비슷한 그런 느낌. 사람들은 이 이야기의 무엇에 매력을 느꼈을까 하는 그런 탐구 같은 기분으로 읽었다. 꾸역꾸역.
꽤 심한 악평을 하며 대략 4천자에 걸쳐 장문으로 투덜거리고 있지만 나도 그것을 아예 모르겠던 건 아니었다. 그 정도로 남들과 동떨어져 있진 않다…고는 생각한다. 작가의 상상력은 매우 훌륭했다. 한국판 해리포터라고 해도 좋을만한 책 초반의 느낌. 몽환적이고 동화 같은 따뜻한 그런 느낌. 꿈을 판매한다니. 그 상상력은 매우 훌륭했다. 다만 나에겐 작가의 반짝이는 이런 상상력을 즐기지 못할 만큼 단점이 너무 크게 나가왔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 크게 와닿아서 도저히 이야기에 집중할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2권은 1권에서 실망했던 부분은 개선되지 않았고, 읽으면서 즐길 수 없을 만큼 몰입을 방해하는 부분은 더욱더 눈에 띄었다. 1권에 비해 더 심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이미 1권에서 작가의 상상력은 충분히 많이 느꼈기 때문에, 2권에서는 1권의 장점인 상상력조차 느낄것이 없다. 그 상상력은 이미 1권에서 전부 느꼈고, 2권에서 새로이 느낄 그런 즐거운 상상력은 많지 않았다. 1권에서 즐겁게 느꼈던 것조차 없어져서 이제 단점만 남은 그런… 이건 마치 좀 그런 느낌… 싫어하는 사람은 숨만 쉬어도 싫은 그런 느낌을 책에서 받았다. 싫어하지만 인정할 부분이 있었던 1권에 비해 2권은 인정할만한 부분조차도 굉장히 줄어든 그런 느낌… 다른 사람들은 분명히 그냥 소설적 허용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이 그냥 넘어가지질 않았다. 왜 주변에 그런 사람 한둘쯤 있잖은가. 밥 먹는 게 처먹는 걸로 보이고, 맞는 말을 하지만 동의해 주기는 싫고, 숨 쉬는 것도 가끔은 꼴 보기 싫은 그런 사람. 이 책이 나에겐 그런 것이었던 것 같다. 이런 후회가 되는 금전적인 소비도, 시간의 소비도, 감정의 소비도 하지 않고 싶다. 설마 3권도 나오진 않겠…지? 왠지 3권이 나오면 3권도 옆에 꽂아놓고 싶은 그런 허튼 생각이 들 것 같은 기분이 든다. 혹시나 그런 허튼 마음이 든다면, 그땐 읽진 않고 데코용으로 옆에 꽂아만 둬야겠다. 금전적인 소비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미 두 번이나 한 실수를 세 번하는 일은 없을거다. 어차피 읽으려고 산 책도 사놓고 안 읽는 것도 많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