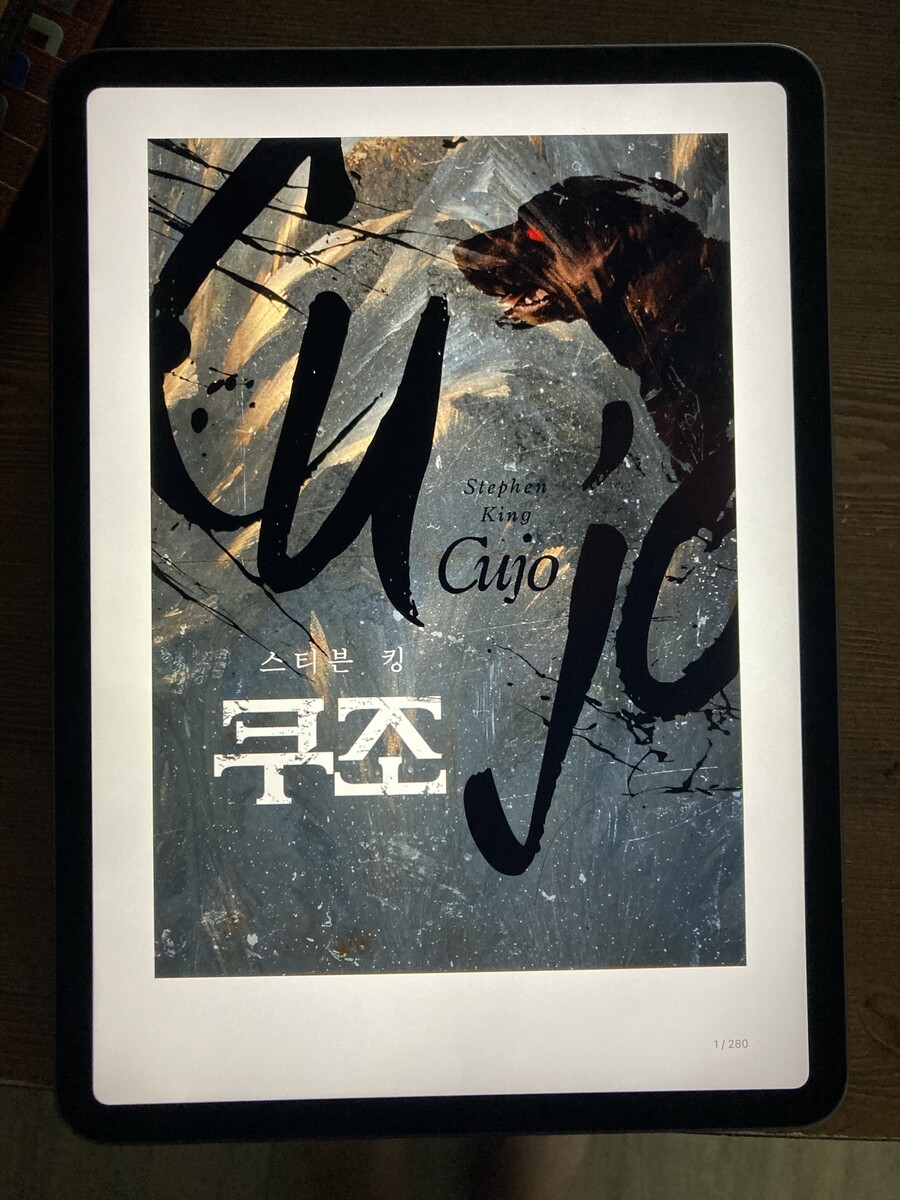1980년에 발간된 스티븐 킹의 소설. 스티븐 킹이 자서전처럼 쓴 ‘유혹하는 글쓰기’에서 마약과 술에 찌들어서 산 적이 있었고, 그 시기에도 집필 활동은 쉬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시기에 쓴 책이 이 ‘쿠조’다. 그는 그 책에서 그 시기에 대하여 회상하는 말을 하면서 ‘이 말을 하면서 나는 자랑스럽지도 부끄럽지도 않고 다만 막연한 슬픔과 상실감을 느낄 뿐이다’ 라고 했는데 굉장히 멋진 문장이라 생각한다. 나도 나의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의 부끄러운 일들에 대해서 쓸 때 저런 느낌을 느끼기도 한다. 일그러진 내 모습에 대해서 글을 쓸 때, 나도 이런 감정을 느낀다. 덤덤함, 약하지만 막연한 슬픔. 뒤틀린 나를 보면서, 내가 잃은 것들을 생각하며 느끼는 상실감. 다만 작가의 이 ‘시궁창 속에 박힌’ 시절은 지나갔지만 내 이야기는 현재 진행형이고, 끝날것 같지도 않다. 그의 문제는 일시적인 탈선었지만 나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책의 소재가 일단 요즈음에는 공감하기 어려운 소재다. 광견병에 걸리게 된 대형견으로 인해 벌어지는 이야기이니 최대한으로 잡아도 내 세대 정도가 공감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 아닐까 싶다. 나 어릴 시절에만 해도-실제로 보거나 가까이에서 들은 적은 없었지만- 주변 어른들과 여러 매체에서 광견병 걸린 개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었으나 요즘은 광견병의 ㄱ도 들어본지 오래 됐다. 끽해야 야생동물이 광견병을 옮길 수 있다는 이야기 정도. 주요 소재인 광견병 뿐만이 아니라 이야기의 긴장을 만들어내는 상황 조차 40년 전인 그 시기와는 다르게 현재 시대에서는 아예 성립이 되지 않는다. 1980년대를 무의식중에 30년쯤 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셈을 해보니 40년도 넘었다. 허허허… 이 소설이 나올 때 즈음하여 태어난 나도 한달 뒤면 40이다 허허허허허허헣…
그런 이유들 떄문에 상황에 몰입해서 보기는 쉽지 않았다. 다만 책을 손에서 놓지는 못했는데, 상황 자체에 대한 몰입이라기보다 상황을 풀어가고 이끌어가는 작가에게 이끌려서 그랬던 것 같다. 작가가 상황을 끌어나가는 스킬. 긴장감을 유지하는 방법 등에 이끌려 끝까지 손을 떼지 못 하고 보게되었다. 이 작가의 많은 책들과 마찬가지로 이 책도 영상화 되었는데, 찾아볼 일은 없겠으나 꽤 고어하게 표현된 부분이 있는 책과는 달리 고어한 부분은 다 잘리고 순한맛으로 표현이 되었다고 한다. 1982년에 나온 영화로 꽤 흥행도 된 편.
50여년. 워낙 오래 활동한 작가이다보니 예전에 쓴 책들의 배경이 지금과 동떨어져서 몰입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읽을 책이 산적해 있는 관계로 당장 읽지는 않겠으나 이 작가의 다른 책들은 어떨까 매우 기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