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후 최고의 묘자리
‘파묘’! 국내에서 천만 관객을 동원한 것에 더해 해외에서도 흥행을 이어가고 있더군. 박수 보냅니다!
그래서 파묘. 흉한 묘자리를 옮기면서 겪는 여러 가지 초자연적 현상을 다룬 영화라는데, 여기까지! 누설 금지요! 나 아직 파묘 안 봤어! (...)
아무튼. 파묘하니까 작년에 언뜻 봤던 신문기사가 생각났어. ‘231cm 아일랜드 거인, 사후 240년 만에 구경거리 신세 면해.’ 무슨 소리인고 하니, 1761년 말단비대증을 갖고 태어난 ‘찰스 번’이라는 인물의 사연이었어. 말단비대증 탓인지 그는 22세 나이로 요절했는데, 이미 본인의 죽음을 예상했었나봐. 자신이 죽으면 바다에 수장해 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했어.
하지만 찰스 번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지. 찰스 번 유체는 500파운드에 영국 해부학자 ‘존 헌터’에게 팔려나갔고, 이후 유골이 대대손손 박물관에서 관광품 마냥 전시되었대. 그러다 작년에서야 전시가 중단됐다만, 끝내 찰스 번의 바람대로 바다장례까지는 이르지 못 했나봐. 이 기념비적인 유골을 연구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서 말이지.
글쎄다. ‘파묘’적 입장에서 찰스 번의 유해를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 그야 말로 240년 원한이 깃들만한 대우 아니니? 당장 파묘해야 할 대상, 앙? ...헌데, 오히려 고인은 파묘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게, 솔직히 난 찰스 번이 부러워. 자신의 유골을 박물관에서 정성껏 관리해 주고, 거기다 연간 8만 명의 관람객이 자기를 보로 와 주었다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이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잊히지 않는다는 것, 좋잖아!
어쨌든 난 그렇게 생각해. 바다에 풍덩 빠져서 사라지는 것 보다, 죽어서도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고 싶어. 여러분은 어때? (...) ...묘자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나는 땅에 묻히기 보다는, 바다에 뿌려지고 싶어. 바다에 뿌려지기보다는 하늘로 돌아가고 싶어. (..?) 그러니까 나는 내 시신을 땅에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해양장으로 다루어줬으면 좋겠어. 해양장 보다는 천장으로 내 장례를 맞고 싶고. 내 죽기 전에 간병AI 로봇에게 신신당부 해 놓을 거야. 에헴.
천장, 다른 말로 조장, 쉽게 말해서 독수리 밥으로 돌아가는 장례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치루기 어려울까?
저기 겨울철 철원 평야에서라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말이지. (짝!) ..내가 천장을 원하는 이유, 시원할 것 같아서야. 푸른 하늘을 보며 산산이 부서지며, 새들에게 보시하며, 죽어서나마 창공을 날고 싶어서... 개똥같은 철학인가! 하!
천장을 못하면 그 다음은 해양장! 해양장은 현실성이 있어. 마침 내 고장 부산에 해양장 시설이 있더라고.
넘실대는 바다에 유해가 흩뿌려지는 것도 장쾌한데, 근데 내가 심해 공포증이 있어서 말이지. (...) 아잇, 죽으면 깨끗이 끝날 거, 끝까지 살아있는 사람 마냥 사후를 따지는 내 자신이 애달파. 그래도.. 거시기가 거시기잖아.. 인정? (...)
천장도 안 되고, 해양장도 안 되고, 그제야 매장 당하고 싶어. ...흙에서 태어난 몸,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스럽다는데, 난 이상하게 땅에 묻히기가 싫어. 살아서도 땅덩이에 얽매인 몸, 죽어서까지 땅에 묶이긴 싫거든.
그래도 이왕 매장 당해야 한다면, 그때는 찰스 번의 유해처럼 사람 곁에 묻히고 싶어. 아무렴, 묘자리는 대도시 한복판이 최고지. 내가 이 사실을 경주 여행하면서 절실하게 체감했어. 경주에 각종 왕릉들, 당대 최고의 권력자 묘자리조차 산중에 있으면 쓸쓸하기 짝이 없었어. 음침한 기운이 절로 돌아.
그런데 평지에 떡하니 들어선 ‘신문왕릉’만큼은 분위기가 달랐어.
옆에는 도로에 차들이 쌩쌩 다니고, 버스 정류장도 있고, 조금 걸으면 민가도 보이고, 활기가 돌잖아? 상대적으로 관광객들도 찾기 오기 쉽고, 앙? 이렇게 살아 있는 사람 손길 닿기 쉬운 곳이 명당 묘자리 아닐까?
엇! 그러고 보니 생각났어! 최고의 매장자리! 내가 죽고 나면 단연 여기에 묻히고 싶어! 바로 부산 북항 친수공원!
저 봐봐. 앞은 탁 트인 바다지, 햇볕 잘 들어오지, 옆에는 오페라 하우스에, 산책하러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때로는 강아지와 고양이도 나올 거야. 여름철 태풍이 불 때면 간간이 바닷물도 실컷 들이킬 수 있고, 얼마나 좋아. 내 돈만 조 단위로 있었어도 부산 북항에 묘지를 건설했을 거다. 농담 아닙니다.
여하튼, 죽음, 장례, 묘자리... 사늘하면서도 무덤덤하네! 이 추위를 이겨내고자 따뜻한 노래를 들읍시다. 윤종신이 부릅니다, 기억해 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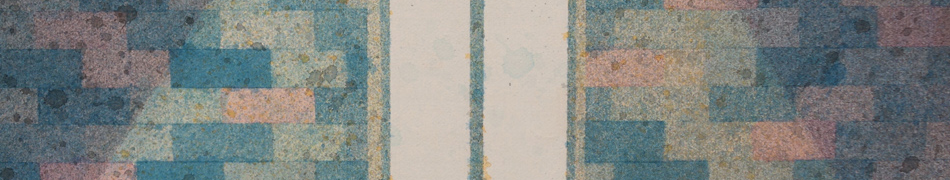

사실 묘자리 만들 땅은 널리고 널린 나라인데... 더군다나 지방엔 인구 소멸로 황무지나 다름없어져 가는데도... 묘자리가 없다는 아이러니가 참... 제정신이 아닌 나라 아닌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