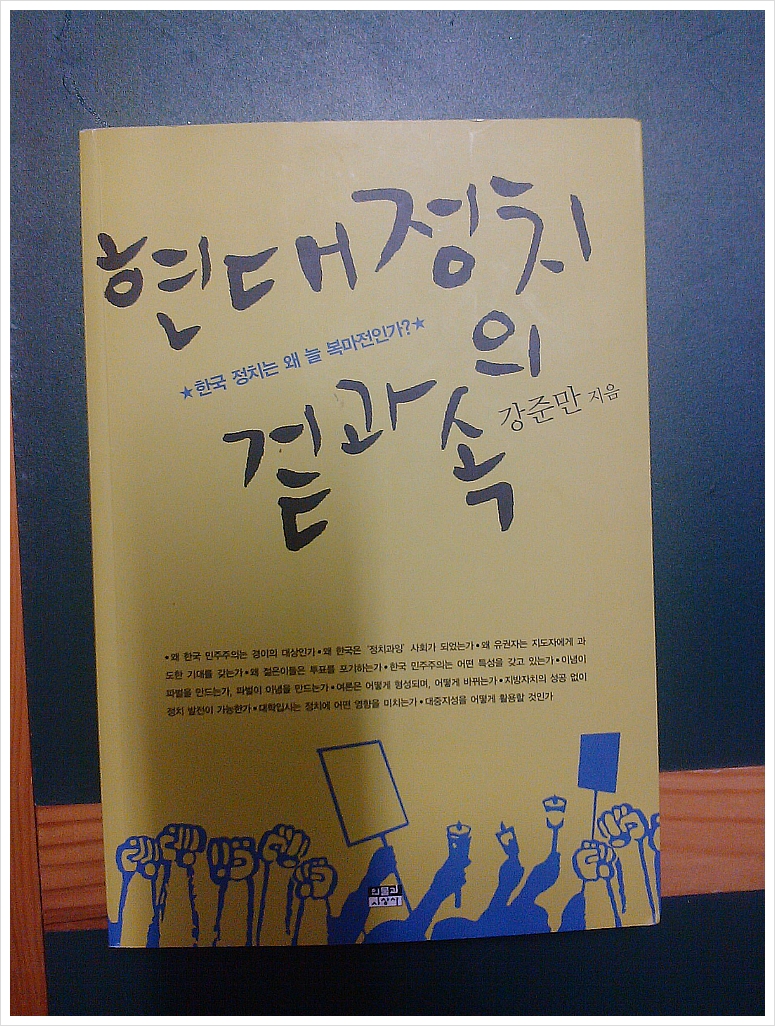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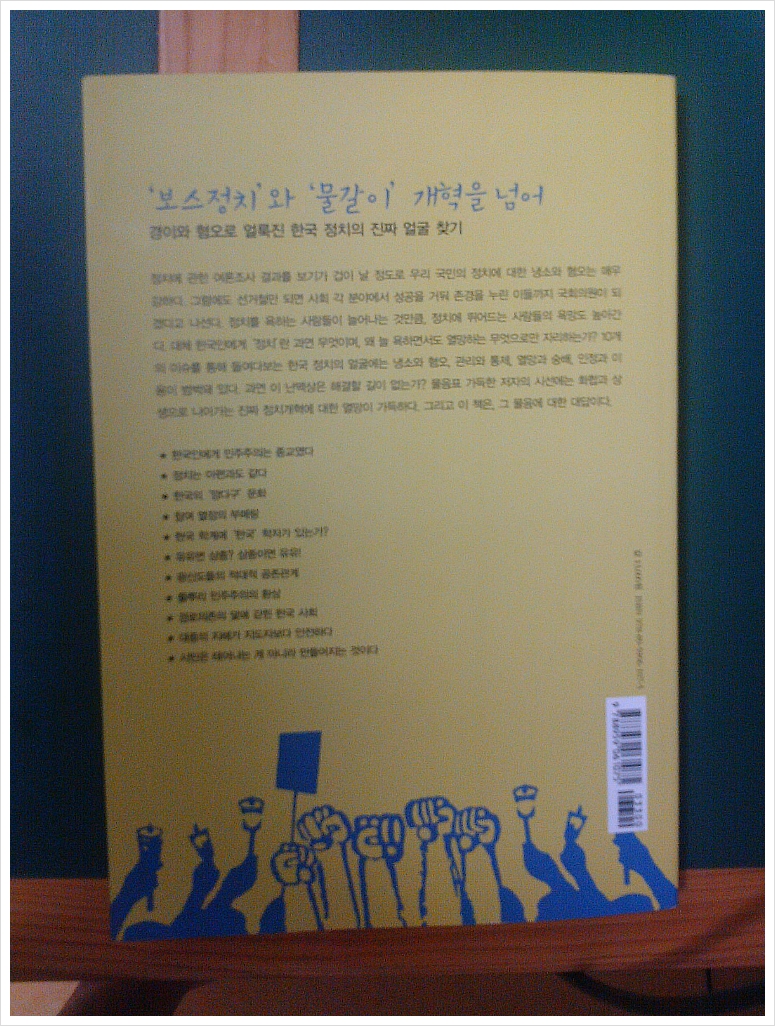
※ 현대정치의 겉과 속, 강준만 지음, 인물과 사상사, 2009.
내가 존경해 마지않은 (지금은 은퇴하신) 교수님께서는 개강 첫 시간에 항상 ‘책’에 대해 세밀한 설명을 하셨다. 이는 흔히 예상할 수 있는 책 예찬론이 아니라, 기술(記述)적 설명으로 책 자체에 대한 강의였다. 책의 크기, 두께, 종이의 질, 책 부분 부분의 명칭(속지, 덧지, 띠지, 가름끈 등), 겉장에 대한 분류 설명(양장, 반양장 등), 그리고 속으로 들어가 지은이 소개, 책의 출판요문(첫 장이나 마지막 장에 있는 책에 대한 전반적인 기록, 출판인, 편집인, 출판날짜 등) 그리고 주석과 참고문헌, 또한 색인(찾아보기)에 대해 다양한 예로 한 시간을 가득 채워 설명하셨다. 단순히 ‘정보 수단’으로서의 ‘책’이 아니라 정서적 친구로서의 ‘책’을 선물 받은 듯 했다.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라 했던가? 선생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책’자체를 사랑하는 법에 대해 가르치신 셈이다. 5년은 수이 넘은 시간이지만 아직 아련하다.
여튼, 교수님께서 위의 내용 중 가장 강조하신 부분은 다름 아닌 주석과 참고문헌, 그리고 색인이다. 책을 고를 때 좋은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위 세 가지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느냐? 라는 건데, 이 말은 아직도 내게 좋은 지침이 된다. 특히나 주석과 참고문헌의 경우에는 몇 가지 재미있는 시각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흥미로운 수용자(독자)의 입장에서 주석은, ‘초여름 대낮에 느슨한 바깥 분위기에 한껏 달뜬 남녀가 교접을 하려하는 찰나 야멸치게 들리는 집배원의 초인종 소리’라는 시각(이 재기발랄한 해석은 디트리히 슈바니츠 ‘교양 -사람이 알아야 하는 모든 것’에서 따왔다)이란 측면이 있고, 다른 하나는 비판적 수용자의 입장에서, ‘나는 당신이 참고한 문헌의 저자만 알아도 나는 당신의 주장을 다 알 수 있다’는(아무래도 움베르트 에코 ‘논문 쓰는 법’에서 본 듯하다)식의 시각이 바로 그것이다. 결국 이 두 시각 모두, 흔히 덧가지라고 여겨지는 ‘부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인데, 나는 여기에 십분 동의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내가 한 때 ‘강준만식 글쓰기’에 열광한 적이 있다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 본다. 흔히 알려진 강준만식 글쓰기는 이른바 ‘편집의 기술’이다. 사실 ‘편집’이란 말은 굉장히 억하심정으로 폄훼한 말이고, 실상은 상세한 일화, 정확한 서술, 그리고 주장에 대한 확실한 논거 제시를 골자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혹자는 이를 보고 ‘짜깁기’라 혹평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실제로 강준만의 몇몇 교양서는 자기표절이라 할 만큼 반복적이고 동일한 논거를 입맛에 맞게 별개로 쓴 경우도 분명 있다. 그러나 ‘짜깁기’ 정도의 발언은 이는 그만한 주석을 ‘생산’해낼 수 없는 다른 저자들의 시기어린 비판이 아닌가 싶다. 실상 그는 ‘인물과 사상사’로 유명세를 얻었고, 이 때 그의 무기는 ‘성역 없는’, ‘서릿발 같은 어조’였던 터라 오히려 ‘출처 분명한 논거’로서의 지금의 글쓰기는 연륜이 빗어낸 ‘정제’의 결과물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강준만의 책은 독자에게 굉장히 친절한 책이다. 여타 다른 인문학 책을 보면 보통 인용문구나 주석 혹은 정의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기 마련인데, 이 저자의 책은 그렇지 않다. 마치 쉬어가는 페이지처럼 세밀하게 풀이되어 있어 초보 인문학도에겐 진입장벽은커녕 대문을 활짝 열어 놓은 셈이다.
다만, 장 · 단이 분명한 것도 특징이라면 특징인데, 강준만이란 이름으로 저자 검색을 하면, 마치 ‘김화백’ 연상케 하듯 수많은 책들이 주르륵 나열되는데, 오죽하면 열혈 독자들도 ‘사서 읽는 것’보다 ‘저자가 집필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며 한탄할 정도로 다작이여서 때론 독자를 벅차게 만든다. 내가 ‘김화백’을 거론한 이유는 강준만씨의 집필 방식도 김화백의 그것과 약간은 닮아 있기 마련이다. 이는 강준만씨도 인정한 바와 같이 그의 제자들이 그의 글쓰기 정보의 편집 방향에 맞는 각각의 정보를 수합 · 정리하여 주지 않는다면 이런 식의 글쓰기는 도저히 나올 수 없을 것이다(저자는 일간, 주간, 월간 간행물을 약 22권정도 본다고 알려져 있다). 물론 강준만씨는 이에 대해 지속적인 감사를 보낸다. 문제는 위의 글쓰기가 완성도를 항상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긴 하지만(다양한 정보와 명료한 시각), 간혹 미비한 저서들도 눈에 띄며 또한 그 일정 수준에서 머문다는 것이다. 편집도 제 2의 창작이라곤 하지만 이대로라면 강준만씨는 유시민씨도 스스로 그렇다고 한, ‘지식소매업자’에 머물지 않을까 걱정이다. 특히 최근의 책들 경향을 보면 답보하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요즘 강준만 교수가 일선(?)에서 한발 물러난 터라 더욱 그러하다.
애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인물과 사상’, ‘한국현대사산책’을 넘는 또 하나의 대작이 나오길 기대해본다.
※ 현대정치의 겉과 속, 강준만 p.5 ~p.149.
한 번 읽은 책인데, 기생수를 지르는 바람에 ‘6월의 책’을 아직 구입 못해서 다시 읽는다. 어차피 읽은 지 오래라 머리가 백지와 같으니(;;) 새롭다고 밖에… ㅠ.ㅠ
오늘 강준만 책에 대한 전체적인 개론을 적은 덕분에 당장 책에 대한 세론은 다음에 쓴다. 옛날에 쓴 게 분명히 있을 터인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니 다시 간략히 써야겠다. 이건 좀 아쉽네…
Ps. 6월 구입목록을 아직 못 정하고 있습니다. '미술'이나 '과학' 관련해서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 되세요~`. 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