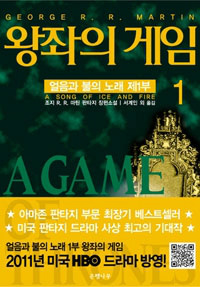
보통 판타지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왜 좋아하냐 물어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대답하다. 화끈하고 통쾌한 게 좋다고. 물론 나도 거대한 드래곤에 검 한자루로 맞서는 절대적 영웅과 수십 대군을 마법 한방으로 전멸시키는 마법사가 나오는 그런 판타지를 좋아했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지금은 그런 소설들이 장난스레 보이는 게 사실이다. 그러다가 우연히 서점에서 집어 든 소설이 반지의 제왕이었고 이런 깊이가 판타지에 있었나 하고 감격했었다. 이 책 얼음과 불의 노래도 우연히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재미있고 또 깊이가 있을 것 같아 사려 없이 8권 모두를 사버린 책이다. 하지만 8권을 다 읽은 후 난 후회하지 않았다. 너무 방대하고 너무 느리고 너무 기다리게 하지만......
한번도 보지 못한 고향대륙에 가기 위해 끝없이 방황하는 조그만 여왕 대너리스와, 신분의 벽에 막혀 자신의 형제들과 같은 길을 못 가지만 그럼으로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가는 존, 마음속에 정의라는 단어가 들어있음에도 세상의 모욕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 전장에 뛰어든 난쟁이 티리온, 이런 인물들의 이야기가 있기에 나는 얼음과 불의 노래를 좋아하게 되 버렸다. 판타지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번 읽어보길 추천한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대목이다. ["애야, 이 말을 명심하거라. 난쟁이는 모두 세상의 바스타드(서자)이지만, 바스타드가 반드시 난쟁이인 건 아니란다." 그렇게 말한 티리온은 돌아서서 휘파람을 불며 다시 연회장을 향해 어슬렁어슬렁 걸어갔다. 그가 문을 열자 안에서 새어 나온 불빛 때문에 그의 그림자가 길게 뜰을 가로질렀다. 아주 잠깐 동안이었지만 그 그림자로 인해 티리온 라니스터는 거인처럼 보였다.] |